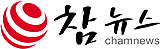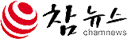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신고한 것이었는데, 폭행의 수위가 높아보이진 않았지만 여성의 서러운 목소리와 애처로운 눈물을 통해 그 여성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전해졌고, 순간 그 여성의 모습과 필자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겹쳐지며 너무나 애달픈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 이라는 말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훈화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법규와 관료제에 근거하여 반복적, 규칙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인권을 단순히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는 규칙 또는 규제 정도로 국한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법과 규칙으로 인권을 이해한다면, 인권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귀찮은 서류 한 장을 더 만들어야 하는 ‘족쇄’ 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권을 개념화 하거나 ‘인권을 지켜야 한다’ 고 선언하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유대’에서 출발한다면 조금 다른 정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분노로 느낄 줄 아는 것이 공감이다. 공감은 타인의 처지에 자신의 의식과 심리를 투사할 줄 아는 능력인데, 이것을 ‘역지사지’ 라고 한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역지사지’ 로 인해 인간은 자신과 타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된다.
남자친구에게 아픔을 겪은 20대 여성의 모습에서 나의 여자친구를 떠올릴 수 있고, 길 잃은 치매 할머니를 보며 나의 어머니,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며 나의 아들, 나의 동생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투사된 ‘역지사지’ 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을 넘어 멀리 사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 일테다.
어렵지만 그 끈을 잘못을 저지른 피혐의자에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이 말이 주는 함의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라” 는 것일 테다. 다시 말하면, “ (나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가족과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들이 나의 가족과 형제와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피혐의자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 질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감수성을 실천에 옮기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직업, 경찰은 참으로 성스러운 직업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