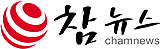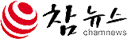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놀란 소식을 들었다. 평년과 같았더라면 여름이어야 할 호주가 때 아닌 한파로 눈이 내렸다고 한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놀란 소식을 들었다. 평년과 같았더라면 여름이어야 할 호주가 때 아닌 한파로 눈이 내렸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수가. 그러고 보면 전 세계 곳곳이 기후나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과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별로 그만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가을, 온도차와 기후에 문제가 있어 단풍다운 단풍은커녕 온통이 말라죽은 나뭇잎들만 볼 수 있었다.
게다가 11월 초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건 또 어떠한가. 과연 문제이기는 한 듯 보인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라는 미국의 생태학자가 있다. 그녀는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최고의 화학약품이란 인식되어 온 농약과 살충제의 위험성을 파헤쳤기 때문이다.
당시는 화학회사와 화학공업계가 번창일로에 있었던 때라 그녀의 책은 화학시장에 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에 따른 후폭풍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만큼의 의지와 열성은 지금까지도 그녀가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침묵의 봄’은 환경오염의 재앙을 경고했다. 자연에 살포된 농약과 살충제가 애초 박멸하고자 했던 해충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중독시키고, 땅을 오염시켜 나무를 죽게 한다. 나비가 없으니 꽃도 피지 않고, 새들이 없으니 봄도 오지 않는 그럼 죽음의 봄이 올 것이라는 말했다.
‘침묵의 봄’은 환경오염의 재앙을 경고했다. 자연에 살포된 농약과 살충제가 애초 박멸하고자 했던 해충에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을 중독시키고, 땅을 오염시켜 나무를 죽게 한다. 나비가 없으니 꽃도 피지 않고, 새들이 없으니 봄도 오지 않는 그럼 죽음의 봄이 올 것이라는 말했다. 일부 환경낙관론자들은 40여년이 지난 지금 카슨이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카슨이 지나치게 상황을 과장했던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책이 발간된 이후, 환경에 대한 우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화학물질도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되었다.
그녀가 경고했던 건 60년대의 과학이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발전해 간다면 향후에 엄청난 환경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거듭된 경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환경은 아마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다. 참혹한 봄의 광경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 봄과 가을이 거의 없이 여름과 겨울이 오고, 폭염과 폭설, 폭우 등이 이어지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너울은 해안가 마을을 덮쳐 때아닌 수해를 입고 있다. 앞에 말했듯 여름이 다가와야 할 곳에 눈이 오는가 하면 미국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케인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 정리된 지리적 기후 특성은 과연 지금의 상황과 들어맞을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재해선포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히 돌아봐야 할 때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한번에 몰아닥치는 재앙이 아니라서 두 손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너무 늦어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전에 말이다.
annybim
annybim